[김동환의 월드줌人] '아버지의 직감' 뇌사 아들 되살린 아빠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뇌사상태에 빠진 27세 남성의 생명유지장치를 끄자는 말에 이들은 동의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자리에 없었다. 남성의 아버지 조지 피커링(59)이었다.
그때 조지가 병실에 들어섰다. 그는 권총 한 자루를 들고 있었다. 조지는 의사들에게 총을 겨눈 채 “아들을 보내지말라”고 소리쳤다. 아직 조지는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병실에 들이닥쳤다. 조지는 경찰과 의사들을 마주한 채 4시간 정도 대치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과 맞서는 동안 누군가 조지의 옷자락을 살며시 움켜쥐었다. 조지의 아들이었다. 그는 자신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기라도 한 듯 의식을 되찾았다. 영화 같지만 미국 텍사스의 한 병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조지의 아들은 올 1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었다. 의사들은 조지의 아들을 살펴본 뒤, 혼수상태인 그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가족들에게 말했다.
조지의 전처와 그의 아들은 알았다고 했다. 조지의 아들은 곧바로 장기기증 리스트에 올라갔다. 그가 죽더라도 누군가는 살아야 한다고 가족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지는 일련의 과정이 빠르다고 생각했다. 그는 “병원도 그렇고, 간호사들과 의사도 이상했다”며 “그들은 매우 빨리 움직였다”고 말했다. 조지는 다른 과정은 차치하고라도 생명유지장치를 끄라고 한 순간부터 3시간 정도만 더 지켜본다면 아들에게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경찰과의 대치도 피하지 않았다.

영화 같은 일이 생겼다. 조지의 아들이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아버지 생각대로 4시간 가까이 흐르고 나서였다. 만약 의사들이 조지를 밀어내고, 생명유지장치를 껐다면 그의 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뻔했다.
아들이 의식을 되찾은 것을 보고 나서야 조지는 순순히 경찰에 체포됐다. 그가 갖고 있던 총은 다른 아들이 넘겨받았다. 병원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검거됐지만, 아들이 살았으니 다행이라며 조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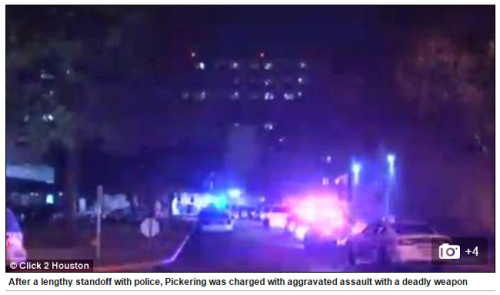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된 사법당국이 조지에게 최근 무죄판결을 내렸다. 아들을 살리고자 총을 겨눴던 조지의 행동, 그의 아들을 오진한 병원의 잘못 등을 모두 고려한 데서 나온 결과다. 조지는 잠시 철창신세를 졌지만, 다시 아들 곁으로 돌아가게 됐다.
조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을 살렸다고 믿는다.
“법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습니다. 저를 살게 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 예, 사랑입니다.”

네티즌들은 조지를 칭찬했다. 아버지로서의 직감이 아들을 살렸다고 입을 모았다.
영국의 한 네티즌은 “조지를 올해의 아버지로 선정해도 될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았다. 미국의 다른 네티즌은 “사랑은 어디든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반응했다. “나쁜 의사들이네”라는 네티즌의 댓글에는 수많은 공감이 이어졌다.
한편 병원 측은 미국의 한 매체에 보낸 답변에서 “의사들은 지식과 노하우 등으로 환자를 호전시키는 데 힘쓴다”며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태가 나빠진다면 의료진은 향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 번째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의료진 차선책도 환자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법조계와의 접촉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kimcharr@segye.com
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 마음의 양식 > 좋은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람답게 사는길 (0) | 2018.04.03 |
|---|---|
| 성공/실패 (0) | 2018.04.02 |
| 진실/진리 (0) | 2018.04.01 |
| 글과 그림 방을 만들면서 (0) | 2018.03.31 |
| 세상은 그렇게 그렇게 가는거야 (0) | 2015.08.13 |
| 나의 행복도 불행도 내 스스로가 짓는 것.ㅣ잊을수만 있다면 -봉은주 (0) | 2015.08.03 |
| 코카콜라 회장의 유서!! (0) | 2015.07.26 |
| [스크랩] 스님과 아이 (0) | 2015.07.26 |